인공지능은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을까?
김별아(소설가)
발행일 2016.04.08. 13:20

| 모닥불은 계속 지펴지는 데다 달빛은 또 그렇게 고와 동네는 밤새껏 매양 황혼녘이었고, 뒷산 등성이 솔수펑이 속에서는 어른들 코골음 같은 부엉이 울음이 마루 밑에서 강아지 꿈꾸는 소리처럼 정겹게 들려오고 있었다. 쇄쇗 쇄쇗... 머리 위에서는 이따금 기러기 떼 지나가는 소리가 유독 컸으며, 낄륵-하는 기러기 울음소리가 들릴 즈음이면 마당 가장자리에는 가지런한 기러기 떼 그림자가 달빛을 한 옴큼씩 훔치며 달아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별 하나 주워볼 수 없고 구름 한 조각 묻어 있지 않았으며, 오직 우리 어머니 마음 같은 달덩이만이 가득해 있음을 나는 보았다. 달빛에 밀려 건듯건듯 볼 따귀를 스치며 내리는 무서리 서슬에 옷깃을 여며가며, 개울 건너 과수원 울타리 안에서 남은 능금과 탱자 냄새가 맴돌아, 천지에 생긴다고 생긴 것이란 온통 영글고 농익어 가는 듯 촘촘히 깊어져가던 밤을 지켜본 것이다. -- 이문구 《관촌수필》 중에서 |
소설가 김별아의 ‘빛나는 말 가만한 생각’ 119
“우린, 망했어!”
아침에 일어나니 어젯밤 지껄인 수많은 말들 중 기억나는 건 그 한가지였다. 우리는, 이른바 문학을 한다며 십 수 년 이상을 애면글면해 온 소설가들이다. 서점에 신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도 이메일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은 모두 제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책 비슷한 걸 펼쳐보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무슨 책을 읽는가보다 이런 별종은 누군가가 더 궁금하다.
“일본에선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했다지 않아?!”
몇 번인가 문학상 심사를 해본 경험으로 말하자면,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다. 인류가 문자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 남긴 모든 문학의 자료를 업데이트한 인공지능이라면 흥미로운 소재를 가려 뽑고, 적절한 주제를 기저에 두고, 치밀하게 구성하는 측면에서 웬만한 작가는 뺨치고도 남을 것이다. 아무러한 책벌레라도 그보다 더 많은 문학 작품을 소화한 ‘인간’은 없을 테니까.
“이젠 대학에도 국문과가 없어. 대신 한국어교원학과가 생겼지!”
국문과 석사 과정을 마친 누군가는 박사 과정으로 한국어교원학과에 들어갔단다. 국어국문학과가 한국어학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젠 한국어교원학과라니, 하긴 국문과와 전자전파공학과를 융합해서 웹툰창작학과를 만든다는 지경에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그래도 작가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직업이라는 말은, 미안하지만 위로가 안 된다. 독자가 사라지고, 책이 사라지고, 작가들은 알파고를 이기기 전에 생활고로 사라질 판국이다.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고, 숙취와 상관없는 가슴이 쓰리고 아플 때, 문득 책장에서 이문구 선생의 소설을 빼어든다. 충청도 사투리와 농촌 배경의 자료들을 모두 입력하면 인공지능도 이런 구절을 쓸 수 있을까? 수술 후 암이 재발해 백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마지막으로 뵈었던,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선택으로 연명 치료를 포기했던, 그 와중에도 끝까지 능청스럽고 넉넉하게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던, 선생이 새삼 그리운 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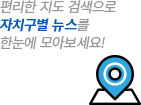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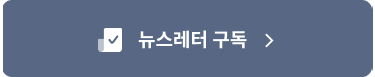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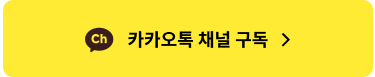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