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건넜던 한강 다리가 조선 시대 유적이라고?
곽재식 교수
발행일 2025.03.26. 15:33


곽재식 교수의 ‘서울 속 숨은 과학 찾기’ (28) 강철로 지은 한강철교
그 때 한 전신 회사에 말단 허드렛일 담당으로 취직한 앤드류라는 한 스코틀랜드 이민자 출신의 소년이 있었다. 그는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일을 했지만 어깨 너머로 전신 기술을 조금씩 익혔고 결국 기술자로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전신 사업에서 그 시절 기술 산업의 분위기를 익히게 되었고 얼마 후 전신과 함께 당시 미국에서 급격히 성장하던 또 다른 신기술 사업이었던 철도 사업에 관한 일도 하게 된다.
마침 앤드류는 철도와 관련한 투자로도 돈을 버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 만의 기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고, 곧 철도 사업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다음 단계로 그는 철도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강철을 생산하는 사업에 투자해 더욱 큰 돈을 벌어 미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갑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강철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별명은 지금까지도 유명하다. 이것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의 젊은 시절 이야기다. 지금도 누가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면 ‘공연이 잘 되나 보다’라는 인상을 주면서 언론에 보도될 때가 있는데, 카네기홀 같은 곳의 이름 역시 바로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부자였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강철 대량생산 기술을 도입한 미국의 강철왕
강철은 단순히 철 중에 좀 강한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순수한 철에 아주 약간의 탄소가 섞여 있도록 만든 제품을 강철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스틸(steel)이라고 해서 단순한 철을 뜻하는 아이언(iron)이라는 말과 선명하게 단어가 구분 되어 있다.
철에 탄소가 전혀 없으면 철이 너무 물렁물렁해지고 그렇다고 철에 탄소가 너무 많이 섞여 있으면 철이 지나치게 딱딱해져서 힘을 받으면 잘 깨지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강철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기에 여러 용도로 쓰기에 튼튼한 소중한 재료다.
옛 사람들도 강철이 그냥 대충 만든 철 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1473년 음력 2월 11일 기록을 보면, 철을 다루는 장인으로 수철장(水鐵匠)이 있고, 정철장(正鐵匠)이 있다는 구절이 보인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철장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다.
수철장에서 수철이라는 말은 아마도 무쇠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쇠는 옛 기술로 적당히 만들어서 탄소가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철을 일컫을 때가 많다. 그렇다면 정철장은 무쇠보다는 더 복잡한 재료면서 더 품질이 좋은 철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 아마 정철이라는 말이 조선 시대에는 요즘의 강철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강철이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된 사례도 있기는 한데, 성정용 박사의 연구 등을 참고하면 아마도 정철 중에서도 특별히 더 좋은 것을 강철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싶다.

요즘도 전로는 자주 쓰이고 있어서, 가끔 TV에서 애국가 영상이 나올 때 공장에서 쇳물 든 통이 뒤집어지면서 거기서 빛나는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전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 모습을 용광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대로 따져 보자면 용광로와 전로는 다른 장치다.
용광로는 선철이라고 하는 탄소의 양이 조절되지 않은 철을 만드는 장치고, 거기서 나온 선철을 전로를 이용해서 강철로 전환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전기를 이용해서 철을 녹이는 전기로와 전로는 발음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장치다.
유럽에서 강철 대량생산 기술을 도입한 카네기는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강철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강철이 결국 미국 산업을 발전시켰고 나아가 20세기에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싸고 질 좋은 강철은 자동차, 배와 같은 현대 산업 사회의 주요 제품을 만드는 기본 재료이기도 하고 총, 대포 같은 무기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다. 나아가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온갖 기계 장비와 부품의 재료가 강철이기에 일단 좋은 강철이 있어야만 뭐든 큰 공장을 짓고 돌릴 수가 있다. 게다가 현대 도시의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해야 하므로 어디서든 사람이 일을 할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강철은 꼭 필요하다. 넉넉한 강철은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튼튼한 다리다.
강철왕 카네기의 회사에서 생산된 미국 강철은 미국의 성장과 함께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1896년 미국의 제임스 모스라는 사나이가 바로 그 풍부한 미국 강철을 들고 멀리 조선의 수도, 서울에서 사업을 벌일 생각을 한다. 강철로 한강에 다리를 놓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막대한 양의 강철로, 넓은 한강에 다리를 놓다
한국 속담에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그 말은 그만큼 한강을 넓고 변함없는 곳이라고 여겼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큰 강에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 정조 임금 시기의 기록을 보면 많은 배를 늘어놓고 배 위에 널빤지를 깔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배다리를 잠깐 만들었다가 얼마 후 해체하는 정도가 그나마 가장 다리 비슷한 흉내를 내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양의 강철이 있다면 그 커다란 강에도 항상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 제임스 모스는 조선의 조정으로부터 이 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1897년 무렵부터 실제 공사를 추진했다. 공사가 순조롭지는 않아서 중간에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고 모스가 손을 떼고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이어 받기도 했지만, 결국 이 다리는 1900년에 완공되어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로 개통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강철교다. TBS 프로그램 《영상기록 서울, 시간을 품다》에 따르면 이때 미국산 철강 1,200톤을 사용했다고 하니, 태평양 건너 머나먼 조선 땅에서도 강철왕 카네기 시대의 미국 철강 산업이 위용을 떨친 셈이다.

한강에 배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그 위에 건설된 강철 다리는 우뚝하니 남아 주변 도시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한강 북쪽 서울 사대문 안 지역과 한강 남쪽이 연결되면서 서울은 강남 지역을 포함한 커다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강을 도시 중앙에 끼고 있는 독특한 구조로 도시가 발달한 현대 서울의 풍경 역시 바로 이 다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다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A, B, C, D선 네 개의 다리로 구성된 형식으로 바뀌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강철교는 1897년에 공사를 시작한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진짜 유적으로 취급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 한강철교를 지하철 1호선과 KTX 등 서울로 들어가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오늘도 사용하고 있다. 용산으로 가는 급행 지하철이 지나가는 A선 다리에는 그 중에서도 옛 모습이 조금 더 남아 있는 편일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한강철교를 지날 때마다 잠깐 지하철이 조선 시대로 가는 타임머신이 되었다는 상상을 한다. 이 다리가 건설된 직후 조선 시대 사람들이 다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강을 지나는 동안 굉장히 감상적인 기분이 될 때도 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 이제 미국의 강철 생산 산업은 쇠퇴했고 오히려 한국의 강철 생산이 막대한 양으로 증가했다. 현대 한국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이 발달한 이유 중 하나도 질 좋은 강철이 이런 산업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거의 1년에 300만 톤에 달하는 한국 강철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그 때문에 미국 수출에서 철강 관세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도 날씨 좋은 날, 지하철 노들역 근처 용양봉저정 공원에 가 보면 조선 시대 정조 임금이 한강을 건너고 나면 쉬어 갔다는 자리에서 한강철교를 비롯한 몇몇 한강 다리들을 내려다볼 수 있다. 이런 한강의 다리들과 그 주변을 더 잘 가꾸어 나간다면, 다른 선진국의 관광지를 그저 따라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성적인 서울 만의 멋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개굴개굴~ 서울 개구리, 깨어날 때가 다가오나 봄!
곽재식 교수
-
어쩌면 북악산에도? '별에서 온 그 돌' 이야기
곽재식 교수
-
돌을 아십니까? 지구의 나이부터 콘크리트의 라돈까지
곽재식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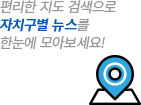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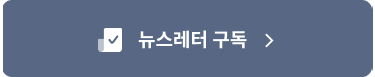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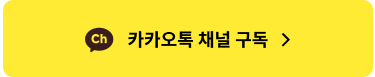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