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북악산에도? '별에서 온 그 돌' 이야기
곽재식 교수
발행일 2025.02.12. 16:40


2019 천체사진공모전 수상작(윤은준 촬영) 페르세우스 유성우
곽재식 교수의 ‘서울 속 숨은 과학 찾기’ (25) 서울에 떨어진 운석 이야기
소행성(asteroid) 충돌은 SF물에서 지구가 갑자기 멸망의 위기를 맞는 원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지구의 종말을 예언했다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굉장히 유행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 보자면 그 무렵 세계가 멸망할 만한 별다른 원인이 없었다. 냉전도 끝났고 세계 경제도 나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국 경제도 IMF 외환 위기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날 무렵이었다. 그렇다 보니, 그 무렵 개봉된 ‘딥 입팩트’, ‘아마게돈’ 같은 영화에서는 난데없이 지구를 멸망 위기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주에서 소행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지구와 충돌하는 바람에 큰 재난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소행성은 주로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물체를 말한다. 지구도 주성분은 돌이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돌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구와 비교할 만큼 커다란 물체를 행성이라고 하고 그보다 크기가 훨씬 작을 경우 소행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른다.
이런 자잘한 소행성들이 우리 태양계에는 수백만, 수천만 개 이상 있어서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 크기도 수백 미터 정도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짜리까지 다양하다. 만약 그 많은 소행성 중 하나가 어쩌다 우연히 움직임이 달라져서 지구와 부딪히는 방향으로 날아 온다면, 정말로 그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가만 따져 보면,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종말에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하다. 공룡이 소행성 충돌로 인한 재난으로 멸망했다는 학설이 이제는 정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룡은 긴 세월 동안 지구 전체에 널리 퍼져 살았지만,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갑작스럽게 그 대부분 멸종 당했다. 그리고 이 대멸종의 원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과학의 큰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월터 앨버레즈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름 10킬로미터 이상의 소행성이 지금의 미국과 멕시코 사이 지역에 충돌해서 재난을 일으켰다는 학설을 1980년대 이후 주장했고, 이것이 지금은 정설로 자리 잡았다. 월터 앨버레즈가 원래는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질학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었다는 사실도 짚어볼 만한 이야기다.
그렇다 보니 소행성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지구 종말, 인류의 멸망과 연결하는 이야기들에 흔히 관심이 쏠리곤 한다.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 12월 27일 발견된 소행성 2024 YR4가 지구와 충돌한다는 소식도 흔히 언론에서는 이렇게 대개 지구 종말, 인류 멸망과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막상 실제 관찰 사례를 따져 보면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로 큰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공룡을 멸망시킨 정도의 소행성은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에 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다.
소행성은 주로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물체를 말한다. 지구도 주성분은 돌이므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돌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구와 비교할 만큼 커다란 물체를 행성이라고 하고 그보다 크기가 훨씬 작을 경우 소행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른다.
이런 자잘한 소행성들이 우리 태양계에는 수백만, 수천만 개 이상 있어서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 크기도 수백 미터 정도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짜리까지 다양하다. 만약 그 많은 소행성 중 하나가 어쩌다 우연히 움직임이 달라져서 지구와 부딪히는 방향으로 날아 온다면, 정말로 그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가만 따져 보면,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종말에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하다. 공룡이 소행성 충돌로 인한 재난으로 멸망했다는 학설이 이제는 정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공룡은 긴 세월 동안 지구 전체에 널리 퍼져 살았지만,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갑작스럽게 그 대부분 멸종 당했다. 그리고 이 대멸종의 원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과학의 큰 수수께끼였다. 그런데 월터 앨버레즈를 비롯한 몇몇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름 10킬로미터 이상의 소행성이 지금의 미국과 멕시코 사이 지역에 충돌해서 재난을 일으켰다는 학설을 1980년대 이후 주장했고, 이것이 지금은 정설로 자리 잡았다. 월터 앨버레즈가 원래는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지질학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었다는 사실도 짚어볼 만한 이야기다.
그렇다 보니 소행성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지구 종말, 인류의 멸망과 연결하는 이야기들에 흔히 관심이 쏠리곤 한다.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4년 12월 27일 발견된 소행성 2024 YR4가 지구와 충돌한다는 소식도 흔히 언론에서는 이렇게 대개 지구 종말, 인류 멸망과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막상 실제 관찰 사례를 따져 보면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로 큰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예를 들어 공룡을 멸망시킨 정도의 소행성은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에 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자주 생기는 일이 아니다.
자갈이나 작은 돌 조각 정도 되는 크기의 유성체들은
당장 오늘 밤에도 수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당장 오늘 밤에도 수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돌덩어리, 소행성과 유성체의 차이는?
그러나 그것 보다 작은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일은 훨씬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지구를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도시 하나를 파괴하거나 일정한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는 소행성 충돌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합천의 초계 적중 분지 지역이 4만 년에서 5만 년 전 무렵, 크기 200미터 가량의 소행성이 충돌한 흔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꽤나 유명하다. 아마도 5만 년 전 합천에 소행성이 떨어졌을 때,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에 살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일은 지금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화제가 된 2024YR4 소행성 역시 100미터가 채 못 되는 크기로 추정되고 있다. 지구 종말과는 아무 상관 없는 크기이지만, 이런 물체가 사람 사는 곳에 추락하면 그 지역은 분명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만한 소행성에 대한 문제는 종말론이 아니라 재해 예방이다. 이런 소행성의 피해는 우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우주에는 소행성보다 더 작은 물체들도 많다. 그리고 그렇게 더 작고 흔한 물체들은 더욱더 자주 지구로 떨어진다.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물체 중에 그 크기가 10미터 이하라면 대개 소행성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유성체(meteoroid)라고 부른다. 이런 물체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불타오르면서 유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갈이나 작은 돌 조각 정도 되는 크기의 유성체들은 당장 오늘 밤에도 수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그보다 덩치가 좀 더 커서, 몇 미터 정도의 크기가 되면 하늘에서 아주 환한 밝은 빛을 내며 가끔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에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빛을 내뿜는 것을 따로 화구(fireball)라고 부르기도 하고, 떨어지는 커다란 유성체가 땅바닥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해서 우주에서 온 돌덩어리가 땅 위를 굴러다니게 되면 그것을 운석(meteorit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만한 소행성에 대한 문제는 종말론이 아니라 재해 예방이다. 이런 소행성의 피해는 우리가 직접 관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우주에는 소행성보다 더 작은 물체들도 많다. 그리고 그렇게 더 작고 흔한 물체들은 더욱더 자주 지구로 떨어진다.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물체 중에 그 크기가 10미터 이하라면 대개 소행성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유성체(meteoroid)라고 부른다. 이런 물체들이 지구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불타오르면서 유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갈이나 작은 돌 조각 정도 되는 크기의 유성체들은 당장 오늘 밤에도 수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그보다 덩치가 좀 더 커서, 몇 미터 정도의 크기가 되면 하늘에서 아주 환한 밝은 빛을 내며 가끔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변에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빛을 내뿜는 것을 따로 화구(fireball)라고 부르기도 하고, 떨어지는 커다란 유성체가 땅바닥까지 내려오는 데 성공해서 우주에서 온 돌덩어리가 땅 위를 굴러다니게 되면 그것을 운석(meteorit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신기한 보약 아닌 재난관리 대상으로
역사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 이래로 한반도에서도 화구같이 폭발하는 커다란 유성체 또한 여러 차례 출현했다. 조선 시대에는 이런 물체의 흔적이 운석으로 발견되면 그것이 하늘에서 신령이 천둥번개와 함께 내던진 신비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고대 중국 신화에서는 천둥의 신인 뇌공(雷公)이 뇌부(雷斧)라는 도끼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조선의 선비들은 큰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운석이 바로 천둥의 신이 던진 뇌부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1441년 음력 5월 18일 기록을 보면, 당시 서울의 경복궁에 있던 궁중의 의사가 어린이에게 좋은 약으로 쓰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뇌부를 찾아 보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을 정도다.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보약 재료로 쓰려고 했다는 말인데, 뭐든 신기한 것이 있다면 일단 보약으로 먹어 보는 용도를 생각하는 한국인의 습성이 그 시절에도 있었나 싶은 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 1441년 음력 5월 18일 기록을 보면, 당시 서울의 경복궁에 있던 궁중의 의사가 어린이에게 좋은 약으로 쓰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뇌부를 찾아 보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을 정도다.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을 보약 재료로 쓰려고 했다는 말인데, 뭐든 신기한 것이 있다면 일단 보약으로 먹어 보는 용도를 생각하는 한국인의 습성이 그 시절에도 있었나 싶은 기록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북악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고 이후 돌이 떨어져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좀 심각해 보이는 이야기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1498년 음력 1월 21일 기록에는 밤에 서울 북악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날이 밝고 가 보니 그 후에 돌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쉽게 생각하면 북악산은 바위가 많은 산이니 우연히 바위 하나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굴러떨어졌고,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을 만하다. 그런데 기록에는 돌이 떨어진 위치가 산꼭대기 쪽이라고 되어 있다. 산꼭대기는 높은 장소이므로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저절로 그곳에 도착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작은 돌이 발견된 정도라면 천둥 같은 소리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1498년 그날 서울의 북악산에 떨어진 것은 어쩌면 유성체였을 수도 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폭발하면서 한 번 큰 소리를 냈고 그 후에 타지 않고 남은 조각이 산꼭대기 즈음에서 운석으로 발견된 것이었을 수 있다. 만약 그 정도의 운석이 북악산이 아니라 민가 근처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실제로 시일이 지나 1505년 음력 1월 14일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을 운석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재난의 징조라고 언급한 내용도 남아 있다. 하필 그때 조선의 임금은 폭군으로 악명 높은 연산군이었는데, 신복의라는 인물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고 연산군이 망한 뒤에야 풀려 나는 사건도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유성체는 여러 차례 관찰된 적 있다. 2020년 9월 23일 밤에는 서울 강남에서 보름달과 비슷할 정도로 밝게 폭발한 유성체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해외의 악명 높은 사례로는 2013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사건도 꼽아볼 만하다. 그때는 10미터 정도 크기의 돌덩어리가 우주에서 떨어졌는데 도중에 폭발하면서 강한 충격을 일으켰다. 그 충격 때문에 수천 채에 달하는 건물의 유리창이 파괴되었고, 1,500명 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 만약 쳴랴빈스크 인근 지역이 아니라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훨씬 더 피해 규모는 커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소행성 충돌, 운석 충돌 등의 사건 역시 자연 재해의 일부로 포함시켜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막연한 종말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일조차 당장 대비할 방법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방어 방법을 준비해야만 하는 과학 기술 연구의 실질적인 과제가 된다.
이미 당국에서도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여 우주 물체 추락 대응 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1990년대 말에 나온 영화에서는 충돌하는 소행성을 막아 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배우들이 대모험을 벌였지만, 21세기인 지금은 그런 일이 민방위 훈련의 과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혹시 북악산을 오르게 된다면 굴러다니는 돌멩이, 놓여 있는 돌덩어리 중에 비범하게 생긴 것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 그중에 500년 전, 마치 폭정을 경고 하듯이 우주에서 떨어진 돌의 조각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학의 가치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일의 의미에 대해 돌이켜 봐도 좋을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북악산은 바위가 많은 산이니 우연히 바위 하나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굴러떨어졌고,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난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을 만하다. 그런데 기록에는 돌이 떨어진 위치가 산꼭대기 쪽이라고 되어 있다. 산꼭대기는 높은 장소이므로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저절로 그곳에 도착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작은 돌이 발견된 정도라면 천둥 같은 소리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1498년 그날 서울의 북악산에 떨어진 것은 어쩌면 유성체였을 수도 있다. 우주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폭발하면서 한 번 큰 소리를 냈고 그 후에 타지 않고 남은 조각이 산꼭대기 즈음에서 운석으로 발견된 것이었을 수 있다. 만약 그 정도의 운석이 북악산이 아니라 민가 근처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실제로 시일이 지나 1505년 음력 1월 14일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을 운석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재난의 징조라고 언급한 내용도 남아 있다. 하필 그때 조선의 임금은 폭군으로 악명 높은 연산군이었는데, 신복의라는 인물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고 연산군이 망한 뒤에야 풀려 나는 사건도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유성체는 여러 차례 관찰된 적 있다. 2020년 9월 23일 밤에는 서울 강남에서 보름달과 비슷할 정도로 밝게 폭발한 유성체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해외의 악명 높은 사례로는 2013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사건도 꼽아볼 만하다. 그때는 10미터 정도 크기의 돌덩어리가 우주에서 떨어졌는데 도중에 폭발하면서 강한 충격을 일으켰다. 그 충격 때문에 수천 채에 달하는 건물의 유리창이 파괴되었고, 1,500명 가량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생겼다고 한다. 만약 쳴랴빈스크 인근 지역이 아니라 대도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훨씬 더 피해 규모는 커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소행성 충돌, 운석 충돌 등의 사건 역시 자연 재해의 일부로 포함시켜 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막연한 종말론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일조차 당장 대비할 방법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방어 방법을 준비해야만 하는 과학 기술 연구의 실질적인 과제가 된다.
이미 당국에서도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여 우주 물체 추락 대응 훈련을 매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1990년대 말에 나온 영화에서는 충돌하는 소행성을 막아 내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할리우드 영화배우들이 대모험을 벌였지만, 21세기인 지금은 그런 일이 민방위 훈련의 과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혹시 북악산을 오르게 된다면 굴러다니는 돌멩이, 놓여 있는 돌덩어리 중에 비범하게 생긴 것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 그중에 500년 전, 마치 폭정을 경고 하듯이 우주에서 떨어진 돌의 조각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학의 가치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일의 의미에 대해 돌이켜 봐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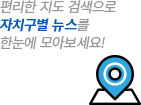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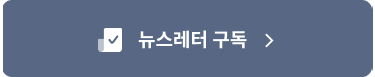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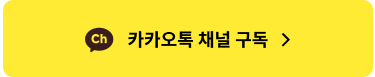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