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잊지말아야할 역사, 삼전도비
발행일 2015.01.26. 17:46
두 바퀴로 떠나는 서울 여행 (30) 병자호란의 아픔이 담긴 '삼전도비'
한강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잠실대교 밑 잠실 나들목으로 들어서면 석촌호수가 나온다. 한강변에서 가까운 석촌호수는 옛날엔 한강의 물길이 닿는 나루터였다. 큰 놀이공원, 호텔, 쇼핑몰이 들어서 있는 석촌호수변에 우리역사의 아픔과 치욕이 담긴 특별한 비석이 있는데 바로 '삼전도비(三田渡碑)'다. 가끔 들어보았지만 실물을 본 건 처음이었다. 삼전도는 1950년대까지 한강에서 나룻배가 다녔으나 1970년대 이후 한강 개발로 사라졌다. 삼전도(三田渡)의 '도'는 섬이 아닌 강나루를 의미한다. 조선 시대 서울 한강에는 5개의 나루가 있었는데, 삼전도는 그 중 하나다.
378년 전인 1637년, 조선의 왕 인조 임금 '이종'은 바로 이곳에서 청태종 '홍타이지' 앞으로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찧었다. 백성에겐 국난이요, 왕조에겐 굴욕이었다. 흔히 조선시대의 2대 국치(나라의 치욕)하면 바로 병자국치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경술국치이다. 병자국치는 1636년 병자년에 발발한 청나라의 침략으로 발발한 병자호란을 말한다. 당시 임금이었던 인조(1623~1649)는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티다 결국 항복하고 나와 한겨울 혹한 속을 걸어 삼전도로 향했다.
높은 단상에 앉아있는 청태종 앞에 끌려 나가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 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3번 조아리는 동작을 3회 되풀이하는)'라는 예를 올렸다. '삼배구고두례'는 여진족의 풍습인데 한 번씩 절을 할 때마다 땅에 이마를 3번씩 박는다고 한다. 실록엔 차마 기록하지 않았으나, 야사에 의하면 이때 인조의 이마에 유혈이 낭자했다고 하니 이만저만한 치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날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병자년에 일어난 국치라 하여 병자국치라고 한다.
전쟁의 여파로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고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포로로 끌려가 청나라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등 패전국의 아픔을 톡톡히 겪게 되었다. 청에게 포로로 이끌려 팔려갔다가 겨우 돌아온 여성들은 환향녀(還鄕女)는 '화냥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은 오랑캐 노비의 자녀를 이르는 '호로자식(胡奴子息)'으로 천대하는 등 큰 사회적 후유증까지 남기게 되었다.
청나라에 대한 항복의 기록이 새겨진 삼전도 비석은 생각보다 커서 누구나 고개를 들어 올려다 봐야할 정도다. 높이 395cm, 너비 140cm이며 머릿돌인 이수와 바닥돌인 귀부를 갖춘 대형 비석이다. 귀부(龜趺, 거북이 모양을 조각한 받침돌) 위에 비문을 새긴 몸돌을 세우고 위에는 용 모양을 새긴 머릿돌을 장식했다. 머리 부분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려고 입을 벌리고 있고, 한 마리의 용은 여의주를 감싸고 있다. 꼭 여의주를 빼앗고 있는 듯한 형상처럼 보였다. 마치 청나라가 조선의 국토와 백성들을 유린했듯이. 바로 옆엔 다른 생김새를 한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이 남아있다. 이는 더 큰 규모로 비석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청나라 측 요구로 원래 만든 귀부가 용도 폐기되면서 남겨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삼전도비는 송파구 잠실동 47번지(당시 경기도 삼전도)에 있는 청나라의 전승비이며 송덕비(頌德碑)이다. 머릿돌에 정식 명칭이라는 '대청황제공덕비(大淸皇帝功德碑)'가 한자로 쓰여 있다. 이 비석엔 특이하게도 3개국의 문자가 새겨져 있다. 비의 앞면 오른쪽에는 만주(여진) 문자로 20행, 왼쪽에는 몽골 문자로 20행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 한문을 새겼다. 17세기 만주, 몽골 문자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단다. 비석의 글자는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 훼손돼 있다. 한 눈에 봐도 자연적인 유실이라기보다는 인위적 훼손으로 추정된다.
굴욕의 역사가 담겨 있다 보니 욕비(辱碑), 석괴(石怪) 소리를 들었던 삼전도비는 또한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삼전도비는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여 조공 관계가 단절되자 고종의 명으로 강물에 수장시켰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다시 그 자리에 세워졌다. 일제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민족에게 지배받은 사실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다. 1945년 광복 후 삼전도비는 분노에 찬 지역민들에 의해 다시금 땅 속에 매몰되었다. 하늘도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인멸을 허용치 않아서였을까? 1963년 발생한 홍수로 비석의 모습이 드러나자, 정부에서는 역사의 반성으로 삼자는 의미에서 사적 제 101호로 지정하면서 송파구에 다시 세웠다.
이후 잠실과 송파가 개발되면서 1980년대 초에 국치의 상징물이라 하여 땅에 묻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에서 외교적 항의가 들어와 500여 평의 공원에 인조 임금이 항복하는 장면을 동판으로 새겨 비석 옆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되었다. 그 후 공원과 동판은 치워졌으나 2007년엔 당시 30대의 어느 시민이 붉은 페인트로 비석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난의 역사를 상징하듯 비(碑) 자체도 이처럼 수난의 세월을 보냈다. 지금 비석의 글자는 대부분 훼손돼 있다. 그러나 비석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선명하다. 치욕과 더불어 치욕의 역사도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굴욕적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삼전도비는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항복 의식을 기록하고 있는 비석이라는 점에서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굴욕적인 유물은 철거되어야 하며 치욕적인 역사는 잊어버려야 하는 것일까? 치욕의 역사를 잊으면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된다. 치욕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치욕을 불러온 원인과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을 겪었음에도 아무 대비도 없이 청나라를 도발한 인조 임금의 무모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1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선조 임금의 어리석음 등이다. 삼전도비 앞에 서있다 보면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린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 위치 : 송파구 잠실동 47번지 ○ 교통편 : 전철 잠실역 3번 출구 도보 10분 |
 김종성 시민기자는 스스로를 '금속말을 타고 다니는 도시의 유목민'이라 자처하며, '여행자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글과 사진에서는 매일 보는 낯익은 풍경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진다. 서울을 꽤나 알고 있는 사람들, 서울을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 모두에게 이 칼럼을 추천하는 바이다. 김종성 시민기자는 스스로를 '금속말을 타고 다니는 도시의 유목민'이라 자처하며, '여행자의 마음으로 일상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그의 글과 사진에서는 매일 보는 낯익은 풍경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진다. 서울을 꽤나 알고 있는 사람들, 서울을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들 모두에게 이 칼럼을 추천하는 바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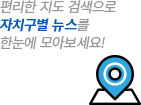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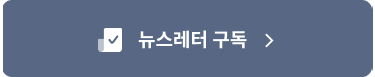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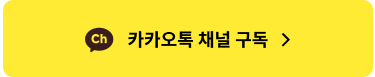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