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건립 이면을 들여다 보니
발행일 2013.01.23. 00:00

[서울톡톡] 서울에 생활근거를 마련한 때가 1975년 초이니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고 있으나 리포터에게 서울은 여전히 낯선 곳이다. 물론 서울 지리,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야 할 경우 방향을 못 잡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서울에 오기 전에 살았던 부산에서와 같은 지역 인지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따지면 서울이 부산보다 던 긴데도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이 부산보다 도시 규모가 방대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아마 고향이 아닌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그렇듯, 고향이란 사람의 사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큰가 보다.
서울에 살면서도 고궁은 나와 가깝지 못한 곳이다. 부산에 살 때에는 서울에 올 경우 고궁이 있는 서울이 여간 부럽지 않았는데 막상 서울이 생활근거가 되면서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던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무심하다. 서울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아이들 눈 구경 시켜준다고 비원(秘苑, 창덕궁)을 간 것이 가족과 함께 한 유일한 고궁산책이었고, 창경궁은 창경원 시절에 두어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고궁 산책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동물원 구경이었을 뿐이다.
경회루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렇게 서설(序說)을 늘어놓는 것은 고궁에 무심한 자기를 되돌아보고자 함이다. 문화유적 방문기 쓰기를 좋아하는 리포터가 그렇듯 가까이 그것도 국내의 어떤 문화유적보다도 큰 비중을 가진, 글감이 풍부한 경복궁 등 고궁들을 두고 무심한 것은 스스로에게도 의문이 아닐 수 없지 않는가!

주지하다시피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正宮)으로 조선 건국으로 비롯했으나 근정전, 경회루 등 현재의 주 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적들은 당시(조선 초기)의 것이 아니고 후대에 그것도 대부분이 근대 또는 현대에 복원한 것들이다. 이러한 점은 리포터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문화유적 글쓰기의 소재로서 여러 감회를 갖게 하는데 특히 경회루에 대한 그것은 특별하다.
서울의 고궁, 정확히 말하면 조선조의 왕궁은 예술성은 몰라도 각 나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풍부한 글감 소재를 가진다. 더욱이 경복궁은 조선조의 정궁이고 그래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가진 곳이다. 그런데도 스스로의 흥미에 깊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가진 역사성 때문이다.
경복궁의 주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경회루,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에 볼 수 있는 그것은 그 건설 과정에 비문명적이고 비인간성들이 얼룩져 있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의 중요 문화재로 존재하는 경회루는 그 건설(재건)에 존재했던 비문명성, 야심이 기조라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명분에 함몰 된 독재자의 아집과 그로 인한 민중의 고혈(膏血)로 이루어진 산물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한 산물은 경회루뿐만이 아닌데도 유독 경회루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용도 때문이다. 역사를 살필 때 슬프고 거부감이 드는 대상은 지도층의 향락을 위해 민중의 고혈을 요구하는 역사이다. 물론 경회루를 그런 범주에 넣는 것은 비약을 넘은 몰이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필자의 양심이다.
리포터는, 그러나 경복궁을 복원한 흥선대원군을 부정적 대상으로만 살피지 않는다. 그가 펼친, 조정을 부패와 무능으로 몰아간 유가(儒家)에 대한 당찬 응징은 오히려 감탄과 더불어 존경을 표하고 싶은 쾌거다. 더욱이 그가 열강이던 프랑스와 미국을 대적하면서 그들을 이 땅에 들지 못하게 함으로 사실 상 승리한 전쟁인 병인(丙寅) 신미(辛未) 두 양요(洋擾)의 결과는 민족적 자존의 표상이라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그의 역작인 오늘의 경복궁, 특히 경회루에 대한 가치 부여에 스스로 혼돈을 겪는 것은 지도자적 자질로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아집과 독선으로 민중의 고통을 불러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통치 행위는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경지에 이르게 하였고 서민들에게는 하루의 삶조차 걱정하게 하였다. 이런 그의 치적(治積)이 경복궁 중건이며, 경회루는 그에 포함된 중요 건축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경회루에 필적할만한 것은 손으로 셀 정도 이고, 또한 그것이 존재함으로 우리 민족이 가지는 자긍(自矜)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내면에 켜켜이 쌓인 부끄러움을 내 사색의 공간에서 밀어낼 수가 도무지 없다. 역사란 후세에게 교훈을 던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가!
경회루가 인 하늘이 칙칙하고 연못에 드리운 그림자조차 무거움으로 가라앉은 듯이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조차 답답하고 무겁다. 이는 날씨 탓이기는 하지만 스스로도 편견이라 수긍할 정도인 조선조(중엽 이후)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과 그것을 느끼게 하는 현실을 보는 때문인 것도 부정할 수가 없다. 뒤편에 아스라이 보이는 인왕산 아래에 존재하는, 실망스러운 현대 역사도 리포터의 인식에 보태야 하니 더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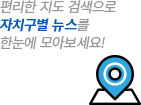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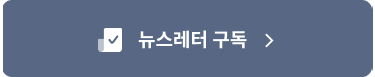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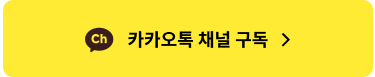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