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신(死六臣)이 아니라 사칠신(死七臣)?
발행일 2013.01.08. 00:00

[서울톡톡] 평소 사육신(死六臣)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만, 스스로 혼돈을 느낄 정도로 그에 대한 생각은 복잡하다. 그분들의 행위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가치 부여에 신념적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을 가지는 것은 그분들의 신념이 대국적인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세조가 왕이 된 절차의 하자를 말하나, 그것은 문제는 있었지만 치유된 상황이다. 왕자든 왕제든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법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왕조시대임을 감안할 때 국가를 위하여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인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생각한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고 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가솔(家率)들이 처참한 화를 당하고 궁극에는 그들이 지키고자 한 단종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간 결과를 만든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선의 추구'이다.
이런 필자가 사육신묘를 찾으면서 유감스럽게도 자기를 두둔케 하는 현상을 접한다. 묘원이 너무 쓸쓸한 것이 그것이다. 묘원 관리자는 이곳의 탐방객이 서울의 여타 사적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데 '시민들이 이곳의 역사성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한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어이없는 광경을 목도한다. 자동차가 묘소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곳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다.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슬프다. 편치 않은 마음으로 경내를 거닐면서는 더욱 안타깝다. 토요일이고 시간도 오전 11시가 넘었는데 한 시간 여 동안 만난 사람은 관리자 외 딱 두 사람뿐이다.
위패가 안치된 의절사(義節祠)에 가고자 불이문(不二門)을 지난다. '불이(不二)'라는 말은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뜻'의 '불교에서 이상(理想)하는 진리'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곳을 통과하면 그런 공간을 만난다는 의미인가 보다. 그런 한편, '불이문'은 불교에서 쓰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유학(儒學)적 가치 공간에도 쓰는 것을 보니 불교 전용이 아닌가 보다. 위패 앞의 향로에 향불을 댕기고는 경건한 자세로 묵념을 올린다.
묘소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묘소를 마주하는 편에서 볼 때 좌측(서편)에 하위지(河緯地), 성삼문(成三問), 유성원(柳誠源)의 묘가 있고,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박팽년(朴彭年), 김문기(金文起)의 묘는 우측(동편)에 있는데 모두 일반 공동묘지에서 볼 수 있는 봉분 모습이다. 각 묘소 앞에는 작은 비석이 있는데 박씨지묘(朴氏之墓) 식이다. 묻힐 당시 신분을 숨겨 표시한 것을 그대로 둔 것이리라. 당초, 이곳은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응부와 성삼문의 부친인 성승(成勝) 등 다섯 분의 묘만 있었으나 성승의 묘는 임진왜란 중에 실전되어 4기 만 남았으며, 1977년 이곳을 성역화 하면서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 세분의 가묘(假墓)를 추가 봉안하여 일곱 기가 되었다.
세조 2년에 작성된 세조실록(병오일조)에 세조 시해(弑害) 사건의 주역은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김문기로 되어 있으나, 추강 남효은(秋江 南孝溫)의 육신전(六臣傳)에는 이들 여섯 분 중 김문기는 없고 대신 유응부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각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나 후세의 입장에서 볼 때 기록자의 성향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세조실록의 기록자가 유응부를 제외한 것은 유응부가 무신(武臣)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편 추강선생이 다섯 문신과 함께 유응부를 육신에 포함한 것은 거사 당일 별운검(別雲劒) 신분인 유응부가 다섯 문신과 같이 거사에 적극적이었다고 본 때문일 것이다. 추강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을 보거나, 그분의 당시 신분을 볼 때 설득력을 가진다. 그 역시 적극적인 단종 추종 세력인 생육신에 포함된 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단종 복위를 꾀한 중심인물은 여섯 분이 아니고 일곱 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육신(死六臣)이 아니고 현재 이곳에 모셔진 일곱 분을 모두 지칭하는 "사칠신(死七臣)"으로 역사 기록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일곱 묘는 주변이 잘 정돈되어 있으나 비탈의 고려 등 묘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져 보이는가 하면 각 묘소의 자리도 불규칙하다. 시신을 묻을 당시 황급함 때문일 게다. 즉, 시신을 수습한 이가 남이 볼까 급하게 매장을 하고는 단지 이곳이 묘지라는 흔적만 남겼고, 성역화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존중한 것이리라. 무덤들을 살펴본다. 시신이 묻힌 네 분의 묘소는 말 할 것도 없고 가묘인 다른 세분의 묘소에서도 그분들의 숨결을 느낀다. 비록 시신은 다른 곳에 묻혔어도 그들의 정신은 이곳에 묻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다. 누구에 대한 원망도 비탄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신념에 대한 자부심의 숨결이다. 자신의 신념을 행동하였고, 그것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보존하고 싶은 그들의 자존심이다. 순간, 필자는 가슴을 찌르는 충격을 느끼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살핀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불규칙한 도시의 소음만 들릴 뿐이다. 왜 그런 충격을 느꼈을까? 그것은 어쩌면 일곱 분의 숨결이 메시지가 되어 필자의 가슴에 전달되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분들의 메시지! 그것은 필자가 존중하는 가치인 정의(正義)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하지만 때때로 외면되는 그 정의의 외침이다. 심장의 충격이 자각된 것은, 필자 스스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를 지키고자 죽음조차 불사한 그분들의 의기를 자기신념을 앞세워 가치를 논한데 대한 노여움의 메시지가 전해진 때문인가?
세상은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음을 당한 분들의 행위를 의기(義氣)라 이해하지만 그것에 가치를 두는 데는 필자처럼 소극적인 것 같다. 그렇듯 세상의 정의관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가변적인 것 같고, 필자는 그런 세상의 한 존재이다. 마치 죄를 지은 듯 황송한 마음으로 묘역을 떠난다. 멀리 파란 하늘을 인 한강이 무언가를 이야기 해주려는 듯 햇살을 소란스레 흩뿌리면서 흐르고 있다.
※ 이 글은 시민리포터의 취재기로 서울톡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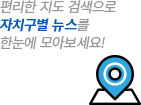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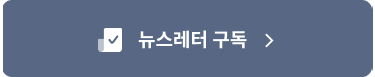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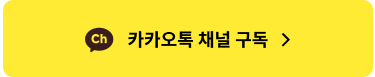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