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0년, 아아 어찌 잊으랴!
admin
발행일 2010.06.18. 00:00
하루하루 일상에 부대끼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뜨거워 문득 시선을 달력으로 돌리면 어느새 6월 중순이다. 6월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6.25의 영상과 자료들이 전쟁세대가 아닌 우리들에겐 새삼스런 일도 아니라, 한국전쟁이나 1,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삼은 특선영화가 상영되기를 기대하는 수준에서 머물곤 한다. 오늘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는「1950..서울..폐허에서 일어서다」특별전에 다녀왔다. 6.25 이후 서울을 통한 변화상을 보고 싶어 들른 작은 전시부스에서는 영상과 사진을 통해 우리 역사의 지난날이 전시되어 있었다. 폭풍 전야의 서울 풍경에서부터 시작해 6.25 전쟁을 경험한 증인들의 '내가 겪은 6.25' 영상을 거쳐, 6.25를 바라보던 외국 주요 언론의 특파원들이 남긴 기록물과 사진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 후 달라진 서울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과 생활이 사진자료와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 전시의 주제는 6.25 그 자체라기보다 전쟁으로 인해 달라진 서울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상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낯설지 않은 '달러빚, 닐리리 맘보, 피엑스' 같은 단어들, 버스안내양을 기억하면 떠오르는 '오라이(all right)', 피엑스문화에서 나온 부대찌개며 그 당시 군에서 이용했던 지프차의 등장, 같은 민족이지만 이념의 차이에서 만들어진 빨갱이라는 단어 그리고 전쟁 후에 사라진 남자들과 남겨진 여자와 아이들에 의해서 생겨난 여초남비 현상이 기록 사진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또한 끝도 없는 기나긴 피난행렬, 부역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식량배급을 받기 위해서 ‘피난민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상황들, 전쟁이 만들어낸 고아와 미망인들, 배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과 전쟁 속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낸 천막학교가 거기에 살아 있다. 전쟁 당시의 피난인구와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실향민들의 발길이 서울에서 묶이면서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급증했고, 실향민들의 강한 공동의식이 해방촌 같은 실향민 마을을 구성하게 만들었다. 실향민과 고아, 미망인들, 그들의 표정 없는 얼굴에서 연평대전이나 초계함 같은 최근의 사건들에서 느꼈던 고통이 그대로 전해와 마음이 아팠다.
핵가족제도는 서구문명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6.25의 산물임을 처음 알기도 했다. 전쟁과 이념의 혼란 속에서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이 불러온 현실적인 대안이 핵가족 형태였던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핵가족 형태가 도시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번져가면서 근대화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가족은 함께 살아내야 했고, 군인은 가족과 나라를 지켜야 했다. 우리 모두는 전쟁 속에서도 오직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몰라도 ‘한국전쟁’은 유명할 정도로 전쟁의 폐허였던 이 나라가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당당한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족과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 불굴의 의지가 모였기 때문이다. 1950년 6.25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유엔의 원조에만 의존했던 나라,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 남단의 작은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곧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실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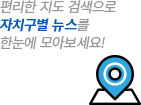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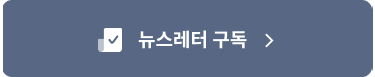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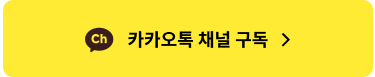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