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인상(石人像)이 모인다
admin
발행일 2008.03.13. 00:00
시민기자 이혁진 | |
|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야외박물관을 들른 적이 있다. 박물관에는 복원한 광혜원 건물이 예전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넓은 공간에 입구부터 여러 형태의 석물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석물 전시가 어딘가 생경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야외공간을 활용한 것이지만 고인돌과 묘지에서 보는 석인상(石人像) 등을 줄지어 세운 것에 언뜻 공감이 가지 않았다. 당시 내 생각은 석물만 따로 전시하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는 격 같았다. 다시 말해 석물과 봉분은 함께 있을 때만이 연구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석물을 보는 순간 박물관은 문화재의 공동묘지라는 파격적 주장이 떠올랐던 것이다. 어쨌든 묘지에서 덩그러니 떨어져 나온 박물관의 석물들이 얼핏 문화재보호라는 명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박물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다. 봉분은 훼손되거나 망실될 수 있지만 석물은 오래도록 남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묘지를 지키는 석장승 모습의 동자석(童子石), 무덤을 밝히는 장명등(長明燈), 분묘를 알리는 돌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망주석(望柱石), 다양한 얼굴과 표정을 하고 있는 문인석과 무인석들, 석양과 석마, 석상인 혼유석과 석상을 받치는 고석(鼓石), 솟대 등 묘역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석물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 점에서 전국에 산재한 석물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야외박물관은 나름대로 뜻있는 장소였다. 한편 최근 노원구가 석인상 야외공원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조선시대 무덤을 구성하는 석인상들을 한데 모아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석인상은 그 시대의 생활상을 담고 조각과 미술 등 예술적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유물이다. 또한 내세관에 따라 유택을 지키는 영험한 대상으로 장묘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문화재다. 요새 숭례문 화재 이후 불타버린 기왓장 하나라도 역사복원과 문화이해에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비록 무연고 고총(古塚)이거나 봉분은 사라졌지만 온전히 자리한 석물들을 늦게나마 보존하고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다행이다. 석인상을 찾아내 한곳에 모아 후대에 그 역사를 널리 전하려는 노력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석인상 공원을 조성하는데 서울시가 예산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한 것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모쪼록 석인상 전시공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기대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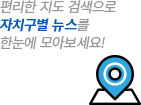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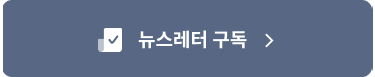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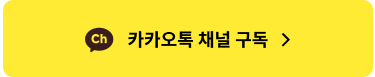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