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궁궐의 방화수통
admin
발행일 2006.08.18. 00:00
시민기자 이승철 | |
|
우리 서울에는 조선시대의 궁궐들이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도 궁궐이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도 궁궐에 가면 으레 웅장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얼마 전 창덕궁에 갔을 때였다. 궁의 중심 건물인 인정전을 돌아볼 때 월대 한 쪽 귀퉁이에 커다란 청동제 화로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퍼렇게 녹이 슨 것이 한 눈에 보아도 꽤 오래된 물건이었다. 그냥 지나치다가 안내하는 문화해설사에게 물어보았다. 무엇에 쓰는 물건이며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고, 안내원은 옛날부터 있었던 방화수통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도 궁궐에 방화수통을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새삼스럽게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월대 아래 저 아래쪽에도 비슷한 물건이 놓여 있었다. 비슷한 용도의 부간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복궁에 갔을 때도 비슷한 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모양도 약간 달랐지만 놓여 있는 위치도 달랐다. 창덕궁에서 보았던 드므나 부간주는 그냥 펑퍼짐한 모양의 그릇이었는데 경복궁의 것은 세 개의 다리가 달려 있는 것이었다. 또 놓여 있는 위치도 아래쪽이 아니라 중심 건물인 근정전의 바로 옆인 상월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경복궁 문화재 담당자에게 알아본 결과 이것은 <정>이라는 것으로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와 함께 하늘의 복을 기원하는 상징물이라고 한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용도와 의미는 사뭇 다른 물건이었다. <드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 넓적하게 큰 독”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에게 외국어처럼 들리는 낯선 단어인 ‘드므’는 순수 우리말인 것이다. 이 드므는 궁궐의 화재를 막기 위해 상징적으로 비치한 물건이라고 한다. 경복궁을 최초를 창건할 때 마주보이는 관악산이 불기운이 성하여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하여 광화문 양쪽에 해태상을 세운 것과 비슷한 뜻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드므는 건물의 가까이에 초기화재시에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는 물을 담아 놓았다는 것이 좀 더 실용적이라고 할까. 그러나 드므의 용도는 실제로 방화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드므에 물을 담아 놓음으로서 불의 귀신인 화마가 왔다가 드므에 담아놓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망친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다. 또 비슷한 모양에 용도도 비슷한 부간주도 액운을 방지해 준다는 역시 상징적인 물건인데 동지 때는 이 부간주에 팥죽을 끓이기도 했다고 전한다. 고대 중국에서도 비슷한 물건을 비치했었다고 전하는데 이것을 문해(門海)라고 불렀다고 한다. 즉 문 앞에 있는 큰 바다라는 뜻으로 화재를 예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다. 우리 서울에 있는 참으로 값진 문화유산인 궁궐을 돌아볼 때 중심이 되는 건물이나 이름난 문화재를 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작고 지나치기 쉬운 물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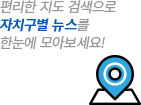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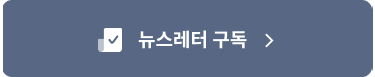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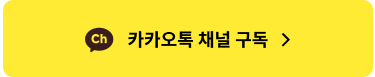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