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의 구조는 왜 역마다 다를까?
내손안에서울
발행일 2004.02.27. 00:00
|
시민기자 한우진 | |||||
늘상 이용하는 지하철이지만,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지하철을 대한다면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상대식 승강장 - '폼|선로|선로|폼' 의 구조 상대식은 가장 일반적인 구조의 승강장으로, 선로의 바깥쪽으로 승강장이 놓여 규모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시공도 용이하다.(승강장 규모는 3호선 남부터미널 같은 소규모에서 6호선 월드컵 경기장이나 2호선 종합운동장 같은 대규모까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 섬식 승강장 - '선로|폼|선로'의 구조 선로 가운데 승강장이 놓여있어서 선로가 곡선화되는 구조로, 이런 승강장은 지상의 도로폭이 좁을 때 주로 건설한다.(예:3호선
종로3가역)
⊙ 2폼 3선식 - '선로|폼|선로|폼|선로'의 구조 이런 승강장은 중간되돌림시에 대단히 유리한 구조이다. 예를 들어 7호선 수락산역의 구조를 보면, 상행(도봉산 방면)으로 가던 수락산행 열차가 수락산역에서 종착한 후 되돌림할 때, 열차가 종착하면 상행승강장으로 승객을 내려주고, 되돌아서 출발할 때 하행승강장으로 승객을 받는다. 따라서 상행방면으로 계속 진행하려는 승객이나 수락산역에서 하행방면으로 가려는 승객이나 계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며, 열차도 회차선까지 들어갔다 나올 필요 없이 곧바로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종착역 회차시에도 노선 말단쪽에 회차선만 있는 것보다 유리하다. 가운데 선으로 바로 되돌아 나오고, 다음 열차는 회차선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회차하면 회차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예: 5호선 상일동, 6호선 봉화산, 7호선 온수 등) ⊙ 쌍섬식 - '선로|폼|선로|선로|폼|선로'의 구조 쌍섬식 승강장은, 선로|폼|선로 구조의 섬식 승강장이 쌍으로 붙어 있는 형태이다. 반면 쌍섬식 구조를 중간되돌림역으로 이용할 경우, 계속 진행방향 승객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4호선 산본역의 경우가 그렇다. ⊙ 1상대, 1섬식 - '선로|폼|선로|선로|폼'의 구조 보통 차량기지에 연접한 역에서 볼 수 있으며, 아침 등 차량출고가 빈번한 시각에 출고에 여유를 두게 해준다. 즉, 출고된 열차가 곧바로 본선에 들어가는 부담 없이 일단 1상대, 1섬식 역의 섬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에 맞춰서 본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7호선 광명역의 경우, 차량기지와 연결된 선로가 하나 더 있으며 2호선 성수역(남쪽으로 3선만 보았을 때), 3호선 수서역도 있다. 또한 분기역의 경우, 두 방향에서 오는 열차가 한 선로로 한꺼번에 합쳐지는 것에 여유를 둘 수 있다. 열차가 본선에서 곧바로 합쳐지는 부담 없이, 우선 승강장에 들어가서 여유를 찾은 후에, 출발할 수 있다. (예 : 상일동발과 마천발이 합류하는 5호선 강동역)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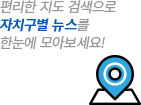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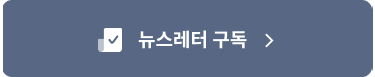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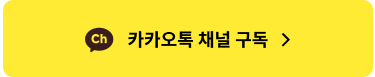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