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원에 대한 가지각색의 이야기
최순욱
발행일 2015.10.14. 17:03

석관에 새겨진 티아마트와 마르둑. 마르둑에게 죽은 티아마트의 몸은 나뉘어 세상이 됐다
최순욱과 함께 떠나는 신화여행 (2) 세계의 기원: 자연에 대한 통찰과 현실에 대한 인식
신화는 어떤 집단 사이에 구전되는 이야기를 총칭하는 설화(說話)의 한 갈래로, 자연 현상이나 특정한 사물, 개념 등을 사람이나 동물의 형태로 구체화한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민담이나 전설은 설화의 또 다른 갈래들인데, 개인적으로 이들과 신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계의 기원과 자연의 운행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화가 여러 이야기들이 연계돼 자연과 우주, 신과 인간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어낸다면, 민담이나 전설은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 신화보다는 좀 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뜻이다.
이렇게 신화를 특징짓는 세계, 또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신화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가지각색이다.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점이 얼마나 비슷한지, 또는 얼마나 다른지 읽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꽤나 쏠쏠한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반고(盤古) 신화는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반고는 태초의 혼돈 속에서 아주 작은 덩어리로 태어나 점차 거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났다. 1만 8000년 동안 혼돈 속에서 잠을 잔 후에 반고가 마침내 깨어났는데, 이때 밝고 맑은 기운과 어둡고 탁한 기운이 각각 위아래로 갈라지며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이후 하늘은 매일 1장丈씩 높아졌고, 땅도 1장씩 깊어졌다. 다시 1만 8,000년이 흘러 하늘과 땅 사이가 9만 리로 벌어졌고, 반고는 그 사이에서 머리로는 하늘을 받치고, 발로는 땅을 버티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반고가 죽어 쓰러졌는데, 반고의 숨은 바람과 구름이, 목소리는 우레가, 눈은 하나씩 해와 달이 됐다. 사지는 산이 되었으며, 피는 강물이, 뼈는 암석과 광석이 됐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티아마트(Tiamat)와 마르둑(Marduk) 이야기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여신 티아마트는 원래 많은 신을 낳은 존경받는 어머니 신이었다. 하지만 자손 중의 하나인 아누가 자신의 자리에 도전하자 격노한 티아마트는 아누의 부하를 본보기로 처형했고 결국 그들과 일전을 피할 수 없었다. 마침내 손자뻘의 무신(武神) 마르둑을 상대하게 된 티아마트는 커다란 입을 벌려 그를 삼키려고 했다. 하지만 마르둑은 폭풍을 불러 입을 닫지 못하게 하고 티아마트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후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몸을 반으로 갈라 하늘과 땅으로 만들었다. 티아마트의 침은 구름과 바람과 비가 됐고 두 눈은 각각 각각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원천이 됐다. 또 가슴은 산이, 꼬리는 은하수가 되었다고 한다. 마르둑은 이 공을 인정받아 신들의 왕이 되었다.”
일단 이 두 신화는 모두 이 세상이 하나의 거인이나 신의 몸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자연은 하나의 신적 존재에서 파생된 것으로 모든 자연물에 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결국 모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태어나서 다른 동식물의 몸을 섭취함으로써 성장한 뒤, 마침내 죽어 다른 동식물에게 섭취되는 거대한 순환을 생각하면 아득한 옛날 고대인의 통찰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다.
차이점도 물론 있다. 반고는 평화롭게 늙어 죽었지만 티아마트는 처절한 싸움을 통한 죽음에 이르러서야 자연을 창조할 수 있었다. 반고처럼 몸이 스스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나뉘어졌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한 것인지 지금 완벽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동쪽으로는 이란 고원,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남쪽으로는 사막지역, 북쪽으로는 카프카스 지역과 연결된 개방적인 지형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는 사실에 비춰보건대, 이런 불안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신화에도 반영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고대인들도 자연에 대한 통찰과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이 정도로 갖추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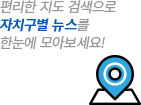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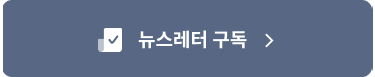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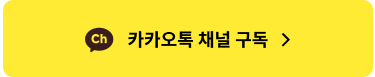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